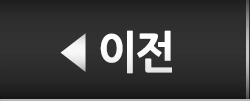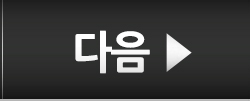화제의 인물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글 : 이경주 기자 / 서울신문, 사진 제공 : 여백미디어) " 소설을 생각하느라 가난을 슬퍼한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 성장기를 보냈다 1920년대 미국 문단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스콧 피츠제럴드가 있었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대표되는 성찰의 문학 세계를 펼쳤다면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갯츠비’로 허영에 찬 사회를 그렸다. 파티와 무희와 리무진과 샴페인은 단골 소재였다. 미국은 이 둘을 대공황 시대의 두 거성으로 꼽는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찰이 필요한 만큼, 지친 삶에 대한 위안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최인호는 70년대 한국의 피츠제럴드였다.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다. 분명 위안이 필요한 시대였다.최인호는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1963년) ‘벽구멍으로’란 작품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4년 후 조선일보에 ‘견습환자’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신춘문예에 당선될 당시 그는 군복무 중이었다. 변호사였던 최인호 아버지는 일찍 작고했다. 하지만 그는 “소설을 생각하느라 가난을 슬퍼한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 성장기를 보냈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그 이외의 희망은 품어본 적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곧바로 인기 작가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상업주의 문학, 호스티스 문학이라고 폄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대의 인간상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무너지는 개인이나 모든 것을 떠나버리는 이들을 묘사했다. 시대 철학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혁명보다 ‘맞아, 나도 그렇지’라는 공감을 통해 모순의 시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위안을 전했다.
그의 작품은 영화나 TV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1974)’,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1975)’, 배창호 감독 ‘고래 사냥(1984)’ 등은 억압의 시대에 방황하던 청춘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는‘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너무 싫어. 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거야.2000년대에 들어서자 작가 최인호는 역사물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2000년, 조선시대 상인의 삶을 통해 바른 상행위와 경영을 이야기한 ‘상도’는 MBC에서 50부작 드라마로 제작됐다. 신라 장군 장보고의 일대기를 ‘해신’이라는 작품 속에 담았고, 이는 KBS에서 51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지난 9월 25일 오후 7시 2분 그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68세. 2008년 침샘 부근에 발병한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최인호는 그 해 6월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침샘암은 침을 생산·분비하는 침샘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및 여러 개의 침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200~300명 정도만 발병하는 드문 암이다. 그는 “환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죽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픈데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너무 싫어. 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거야.”라고 전했다. 암 투병 중에 소설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펴냈다. 지난 2월에는 50년의 문학인생을 담은 산문집 ‘최인호의 인생’도 내놓았다.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당신은 나의 먼지.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야겠다. 나는 생명 출렁인다.이 시는 최인호가 부인에게 불러준 마지막 글이다. 그의 말년이 글이자 종교였음을 보여준다. 글귀처럼, 종교의 빛처럼 먼지가 일어나고, 글이, 죽음 바로 앞의 세상이 생명이 되어 출렁인다. 글도, 죽음의 직전에서 생명을 만난 순간도 영원하다
최인호가 가톨릭에 귀의한 것은 1987년이다. 세례명은 베드로. 고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 등과 가까이 지냈다. 그는 종교적 색채가 담긴 소설 ‘길 없는 길’을 펴냈다. 모순적으로 최인호는 이 소설로 1998년 불교출판문화상과 가톨릭문학상을 모두 수상했다. 국내 잡지에 개재된 소설 중 가장 긴 ‘가족’ 역시 가톨릭 신자인 그의 신앙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1975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4년 6개월간 월간 ‘샘터’에 연재했다. 그는 스스로를 ‘불교적 가톨릭 신자’라고 불렀다. 그는 “내 정신의 아버지가 가톨릭이라면,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죽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그에게 2등급의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이 생전 50년 동안 창작 및 문단 활동을 활발히 해 문학의 대중화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명동성당에서 그의 장례미사가 거행됐다. 고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고래사냥’에 출연한 인연이 있는 배우 안성기가 고별사를 했다. 최인호는 떠났다. 한 시대가 지났다. 상업주의 소설이라고 비판받던 대중의 우상은 사라졌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를 이을 새로운 최인호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서다. 그의 산문집 ‘꽃밭’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인용했다.
당나라 선승 조주가 장례식 행렬을 보며 “하나의 살아 있는 사람을 여러 죽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고인들이 모차르트인지 살리에리인지, 붙박이별인지 떠돌이별인지는 그들을 망각의 어둠 속으로 떠나 보내 잊어버린 후에야 판가름 난다”고 했다. “죽은 사람들을 빨리 잊어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는 것이다.
자신의 책을 모두 태우라던 법정 스님이나 안경 한 개 남긴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쉽게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 자체도 그가 만들어낸 소설 속 인물들처럼 우리의 팍팍한 삶에 위안을 줄테니 말이다.